이익 (실학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1681년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 경기도 안산에서 성장했다. 그는 부친 이하진의 유배와 형 이잠의 죽음을 겪으며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 전념했다. 백과사전식 저서인 『성호사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저술을 남겼으며,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서양 학문을 연구하는 등 개방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는 중농주의를 바탕으로 토지 분배와 화폐 사용 중지를 주장했으며, 당쟁과 양반 제도를 비판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펼치는 등 개혁적인 사상을 제시했다. 이익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실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국의 농학자 - 정약용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실학 사상 집대성, 과학 기술 분야 업적, 500여 권의 저술을 통한 사회 개혁 주장 등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에 선정되었다. - 한국의 농학자 - 유형원
유형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토지 제도 개혁과 과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경세치용 실학 사상을 펼쳤다. - 운산군 출신 - 이태영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은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호주제 폐지 및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했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법조인, 여성운동가, 정치인이다. - 운산군 출신 - 조영식
조영식은 경희대학교 설립자로서 교육, 사회운동, 세계 평화에 헌신하며 네오르네상스운동을 통해 오토피아 건설을 목표하고 문화적 복리주의에 기반한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지향한 인물이다. - 1681년 출생 -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은 1681년에 태어나 1767년에 사망한 바로크 시대의 다작 작곡가이며, 4,0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고 유럽 각국의 음악 양식을 융합하여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 1681년 출생 - 비투스 베링
비투스 베링은 표트르 대제의 명령으로 캄차카 탐험대를 이끌고 시베리아 동부와 북아메리카 북서부 해안을 탐험하여 베링 해협 등 자신의 이름이 붙은 지명을 남긴 덴마크 출신 러시아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이다.
| 이익 (실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한글 이름 | 이익 |
| 한자 이름 | 李瀷 |
| 로마자 표기 | I Ik |
| 호 | 성호 |
| 자 | 자신 |
| 출생 및 사망 | |
| 출생일 | 1681년 10월 18일 |
| 출생지 | 조선 경기도 안산군 |
| 사망일 | 1763년 12월 17일 |
| 사망지 | 조선 한성부 |
| 사망 원인 | 병사 (노환) |
| 신상 정보 | |
| 국적 | 조선 |
| 직업 | 문신, 정치인, 실학자, 철학자, 시인 |
| 분야 | 성리학 |
| 당파 | 남인 |
| 가족 관계 | |
| 배우자 | 고령 신씨, 사천 목씨 |
| 자녀 | 이맹휴 |
| 부모 | 이하진, 권씨 |
| 형제 | 이잠, 이해, 이침 |
| 친척 | 할아버지 이지안, 내재종형 유형원, 사돈 김세렴, 당숙 이원진, 종조부 이지완, 증조부 이상의, 사돈 김세렴 |
| 학력 | |
| 학력 | 한학 수학 |
2. 생애
이익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아버지 이하진이 평안도 운산군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듬해 아버지가 사망하자 경기도 안산 첨성리로 이사하여 형 이잠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러나 1706년 이잠이 희빈 장씨 복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론에 의해 장살되면서 벼슬을 단념하고 안산에서 평생을 보냈다.
이익은 허목의 문하생에게 수학하고, 이서우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이 사망하여 홀로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였다. 아버지 이하진이 연행사로 베이징에서 구입한 수천 권의 서적을 탐독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이익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는 당시 풍조를 비판하고 청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리치의 『천주실의』, 디아스의 『천문략』, 알레니의 『직방외기』 등 한역된 서양 학문 서적을 연구하며 '발'의 형태로 저술했다. 비록 서양 과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양 학문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익의 문하에서는 남인 계열에서 서양 관련 서적을 연구하는 서학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인척 관계로 연결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천주교 신앙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로 서학파는 탄압을 받아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만년에 이익은 선공감가감역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고, 노인직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올랐다. 60대 이후 악성 종기와 풍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1763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2. 1. 생애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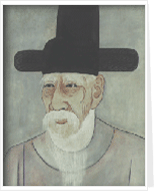
이익의 가문은 증조부 이상의가 광해군 때 좌찬성까지 이르렀지만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아버지 이하진과 6촌 형 유형원은 북인에서 남인으로 전향하였다. 아버지 이하진은 대사헌이었지만,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추방되어 평안도 운산군으로 유배되었고, 이익은 유배지에서 이하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익이 태어난 이듬해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익은 경기도 안산 첨성리로 이사하여 형 이잠을 스승으로 삼았지만, 1706년에 이잠은 아버지를 변호하는 상소 사건으로 인해 장살되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익은 벼슬을 단념하고 안산에서 생애를 보냈다.
2. 1. 1. 출생과 가계
성호 이익은 1681년(숙종) 아버지 매산 이하진과 어머니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는 평안도 운산에서 유배 생활 중이었다. 이익에게는 다섯 명의 형이 있었으나, 아버지와 선대의 고향은 경기도 안산이었으므로 그는 경기도 출신으로 여겨진다. 8대조 이계손(李繼孫)은 성종 때 병조판서, 지중추부사 등을 지내며 가세를 일으켰다.증조부 이상의는 광해군 때 의정부좌찬성을 지냈으나, 인조반정으로 가계가 몰락했다. 이후 아버지 이하진이나 6촌 형 유형원은 북인에서 남인으로 전향했다. 이하진은 남인 중진 문신으로 예송 논쟁 당시 윤휴, 허목, 윤선도, 홍우원의 견해를 지지했고, 경신환국으로 유배되었다.
반계 유형원은 이익의 외6촌 동생이지만, 59세의 나이 차가 났다. 이익의 증조부 이상의는 15세에 장남 이지완(李志完)을 얻고, 여러 아들을 얻은 뒤 40세가 넘어 일곱째 아들 이지안(李志安)을 얻었다. 이지안의 장남 이하진의 아들이 성호 이익으로, 이하진은 53세에 이익을 얻었다. 이익의 당숙이자 이지완의 아들 이원진은 반계 유형원의 스승 중 한 사람이었다.
이복 형 이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으나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고, 둘째 형은 요절하였다. 셋째 형은 섬계 이잠으로 이익의 정신적 지주이자 첫 스승이었다. 넷째 형 옥동 이서(玉洞 李漵)는 후사가 없는 셋째 삼촌 이주진의 양자로 갔고, 다섯째 형 이심도 후사가 없는 다섯째 삼촌 이명진의 양자로 갔다.
2. 1. 2. 불운한 가족사
이복 형 이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으나 아버지 이하진보다 일찍 죽었고, 둘째 형은 요절하였다. 셋째 형 이잠은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첫 스승이었으나, 노론에 의해 장살당했다.[1] 넷째 형 옥동 이서는 후사가 없는 셋째 삼촌 이주진의 양자로 갔고, 다섯째 형 이심도 후사가 없는 다섯째 삼촌 이명진의 양자로 갔다.[1]형들 역시 요절하여 맏형 이해는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이하진보다도 앞서 요절했고, 셋째 형인 이잠은 후일 노론에 의해 장살당한다.[1] 이심에게는 자녀들이 많아, 이심의 아들들 중 이광휴를 맏형 이해의 양자로, 다른 아들 병휴는 셋째 형 이잠의 양자로 삼게 되었다.[1]
1706년(숙종 32) 22년 연상으로 어버이 같고 스승같던 셋째 형 이잠은 그의 나이 26세에 진사의 신분으로 서인 중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희빈 장씨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리어 형문을 받던 중 곤장을 맞고 장살당했다.[1]
2. 1. 3. 불우한 유년기
(재종형 유형원의 스승이자 이익 역시 그의 학통을 계승하였다.)]]이익의 가문은 증조부 이상의가 광해군 때 좌찬성까지 이르렀지만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아버지 이하진과 6촌 형 유형원은 북인에서 남인으로 전향하였다. 이익은 1680년(숙종 6년) 아버지 이하진이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평안도 운산 유배지에서 태어났다.[1] 아버지 이하진은 김석주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유배되었다.[1] 1682년(숙종 8) 아버지가 향년 55세로 사망하면서,[1] 이익은 생후 1년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경기도 안산의 첨성리로 돌아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1]
이후 20세 차이 나는 셋째 형 이잠에게 글을 배웠다.[1] 그러나 1706년(숙종 32) 셋째 형 이잠이 희빈 장씨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형문을 받던 중 곤장을 맞고 장살당했다.[1]
2. 2. 수학과 학문 연구, 후학 양성
이잠에게서 글을 배우고 허목의 문하생에게 수학했다. 이후 스승 없이 홀로 학문하며 허목, 유형원, 이하진의 학문을 공부했다. 1704년 벼슬을 잃고 학문에 전념하던 이서우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으나, 1709년 이서우가 사망하여 짧게 수학했다. 이후 홀로 독서와 학문에 전념하며 사물을 연구했다.집안 대대로 내려온 수천 권의 책에는 부친 이하진이 1678년 연행사로 중국에 갔을 때 구해온 것도 있었다. 이익이 실학에 눈뜨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잃고 농촌에 은거하며 백성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장서를 섭렵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익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풍조를 비판하며 청나라를 긍정했다. 또한, 한역된 서양 학문 서적 (리치의 『천주실의』, 디아스의 『천문략』, 알레니의 『직방외기』 등) 연구를 '발'의 형태로 저술했다. 이익은 서양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은 없었지만, 서양 학문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4]
이익의 문하 남인파에서 서양 관련 서적을 배우는 서학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인척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천주교 (가톨릭) 신앙을 가진 자들도 나타났다.[15] [16]
2. 2. 1. 수학과 청년기
이잠에게 글을 배운 뒤, 미수 허목의 문하생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송곡 이서우를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으나, 1709년 스승이 5년 만에 사망하여 홀로 학문을 연구하였다.2. 2. 2. 과거 포기와 칩거
1705년 증광시에 응시했으나 시소(試所)에서의 주제가 격식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안지에 적은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어 회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13] 1706년 9월 형이자 첫 스승인 이잠이 장희빈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투옥된 뒤 17, 18차의 고문을 받던 중 47세로 옥사하였다.[13] 이후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칩거하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몰두하여 실학과 성리학의 대가가 되었다.2. 2. 3.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이잠에게 글을 배운 뒤 미수 허목의 문하생에게 수학하였고, 이후 별다른 스승 없이 홀로 학문하며 허목, 반계 유형원, 아버지 매산 이하진의 학문을 공부하였다. 1704년 당쟁으로 벼슬을 잃고 학문에 전념하던 송곡 이서우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으나, 1709년 이서우가 사망하여 짧게 수학하였다. 이후 홀로 독서와 학문에 전념하며 사물을 연구한다.집안 대대로 내려온 수천 권의 책에는 부친 이하진이 1678년 연행사로 중국에 갔을 때 구해온 것도 있었다. 이익이 실학에 눈뜨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잃고 농촌에 은거하며 백성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장서를 섭렵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익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풍조를 비판하며 청나라를 긍정했다. 또한, 한역된 서양 학문 서적 (리치의 『천주실의』, 디아스의 『천문략』, 알레니의 『직방외기』 등) 연구를 '발'의 형태로 저술했다. 이익은 서양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은 없었지만, 서양 학문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4]
이익의 문하 남인파에서 서양 관련 서적을 배우는 서학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인척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천주교 (가톨릭) 신앙을 가진 자들도 나타났다.[15] [16]
2. 2. 4. 윤휴, 허목과의 관계
이하진을 비롯한 이익의 선대 인사들은 윤휴와 가깝게 지냈고, 스승 이서우는 윤휴와 허목 모두에게서 수학했다. 그러나 이익은 윤휴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허목을 거쳐 퇴계 이황으로 자신의 학통을 연결하려 했다.[17]2. 3. 만년
1727년 선공감가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20] 1729년 학문과 덕행으로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우로예전에 따라 노인직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60대 이후 등과 가슴에 악성 종기가 심해져 고통받았다. 만년에는 아들을 일찍 여의고 칩거하였으며, 70대 후반에는 풍과 비슷한 질환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할 수 없게 되었다.1751년 강세황에게 도산서원을 그리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 강세황은 도산서원도를 그렸는데, 이때 이익이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자신에게 도산서원을 그리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는 것과 자신의 소감, 현지 답사 내용 및 제작 시기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다.[21] 그는 도산서원도를 애장품으로 하여 머리맡에 두고 보았다. 그는 평생 주자-이황-허목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학문의 정통으로 확신하였다.
1763년 (영조 39년) 11월 병상에 누웠다가 1개월만인 12월 17일에 사망하니,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83세였다. 첨지중추부사로 죽은 후 조정에서는 증직으로 자헌대부 이조판서를 추증하여 생전의 공로를 추모하였다.
2. 3. 1. 정치 개혁론
그는 덕치(德治)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인 통치 수단으로서 법(法)을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고, 형평에 맞게 판결 및 집행을 하며, 연좌제를 금지하는 등 법률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17]또한 국제 외교에서는 실리적인 선택으로 사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약소국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대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이상주의에 젖어 있던 당시의 대외관을 비판하였다.[17]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주의는 꿈을 헤매는 것, 즉 망상과 같다고 여겼다.
이익은 자신의 문집 성호사설에서 조선의 3대 도적으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꼽았다.[18] 그는 정치 부패가 민생 파탄을 낳고, 이것이 도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 3. 2. 병세와 불행한 가정사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아버지 이하진이 유배를 가면서, 이익은 유배지인 평안도 운산군에서 태어났다.[1] 이듬해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경기도 안산 첨성리로 이사하여 형 이잠에게 글을 배웠으나, 1706년 이잠은 희빈 장씨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곤장을 맞고 사망했다.[1]아들 이맹휴(李孟休)는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정랑, 만경현감을 지냈으나 이잠의 조카라는 이유로 출사에 불이익을 당했다.[1] 또한 오랜 병치레로 가산이 줄어들었다.[1] 64, 65세 무렵부터는 등 왼쪽 부분의 질환이 악화되었고,[1] 70세 무렵에는 아들 이맹휴(李孟休)가 먼저 사망하였다.[1]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문인, 제자들이 일부 화를 당하기도 했다.[1]
2. 3. 3. 학통의 분파
성호학파는 천주교 수용 문제로 성호 좌파와 성호 우파로 나뉘었다. 성호 좌파는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벽, 이가환, 정약종, 정약용 형제 등으로 이어졌다. 성호 우파는 서학에 공격적이었으며, 서구의 학문만을 수용하자는 입장으로 성리학자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는 안정복, 신후담과 그들의 문인들, 천주교 수용을 거부했던 이용휴와 채제공의 문도들이었다. 정약용은 후에 천주교가 유교 사상을 보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천주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성호 우파로도 분류된다.2. 3. 4. 생애 후반
1727년 선공감가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20] 1729년 학문과 덕행으로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우로예전에 따라 노인직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60대 이후 등과 가슴에 악성 종기가 심해져서 고통받았다. 만년에는 아들을 일찍 여의고 칩거하였으며, 70대 후반에는 풍 비슷한 질환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할 수 없게 되었다.1751년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강세황에게 도산서원을 그리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 강세황은 도산서원도를 그렸는데, 이때 이익이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자신에게 도산서원을 그리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는 것과 자신의 소감, 현지답사 내용 및 제작시기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다.[21] 그는 도산서원도를 애장품으로 하여 머리맡에 두고 보았다. 그는 평생 주자-이황-허목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학문의 정통으로 확신하였다.
1763년(영조 39년) 11월 병상에 누웠다가 1개월만인 12월 17일에 정침에서 사망하니 당시 그의 나이 향년 83세였다. 첨지중추부사로 죽은 후 조정에서는 증직으로 자헌대부 이조판서를 추증하여 생전의 공로를 추모하였다.
3. 사상
이익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통을 잇고, 정구,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의 사상을 계승, 집대성하여 남인 성리학과 남인 실학파의 근간을 세웠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남인 성리학자와 남인 실학자가 분리되었으며, 주로 근기남인을 형성하게 된다.
3. 1. 경세관
이익의 사상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통에 뿌리를 두며 한강 정구와 허목, 윤휴, 윤선도, 홍우원, 이서우, 이하진, 이잠 등의 사상을 계승, 집대성하여 남인 성리학과 남인 실학파의 근간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 중 남인 성리학자와 남인 실학자가 분리되었으며, 주로 근기남인을 형성하게 된다.3. 2. 학문의 교조화에 대한 비판
그는 불교와 세유(世儒)의 실용적이지 못한 학풍을 배격하고 실증적인 사상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사농합일을 주장했고 아울러 과거제도의 재검토를 제시했다.[1]3. 3. 이기론과 철학
그는 조선 후기 이후로 학문이 지나치게 교조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사서육경에 대한 학자들 개인의 학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며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전주해'에 대하여 송시열 이후의 유학자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교조적이며 자유로운 해석을 못하게 막는 것을 지적했고,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에도 이를 언급하였다.경전과 경서를 절대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으면 찾아서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경전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3. 4. 생명의 위계질서론
성호 이익은 인간과 만물(동물과 식물)이 동일한 속성을 갖지만, 인간-동물-식물의 위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동물 학대와 사냥을 비판하면서도, 인간이 동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고수했다.[17]3. 5. 당쟁과 양반 비판
그는 당쟁의 폐단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불필요한 학문으로 지식인들이 대량생산되고, 양반이 실제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관직을 얻음으로써 재산을 얻을 수 있기에, 한정된 관직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관리가 배출되므로 자연히 당파 싸움이 생긴다고 보았다.[23]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반 계급도 생업에 종사하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며, 과거 제도의 잡다한 점을 없애고 관리 승진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호 이익은 당쟁으로 편이 갈라지는 이유를 이해 타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3] 그는 "무릇 이(利)가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면 당(黨)이 둘이 되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당이 넷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만 많아지면 십붕팔당(十朋八黨)으로 가지가 많아지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23]
3. 6. 여성관
이익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여권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24] 특히 사대부가와 중인층에서 딸에게 글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했다. 그는 여성 교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24] 여성에 대한 지나친 교육은 살림과 가사를 돌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글을 읽고 의리를 강론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부인에게는 계절과 절기에 맞추어 아침저녁으로 의복과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와 손님을 받드는 일이 있으니 어느 사이에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 가끔 고금의 역사에 통달하고 예를 논하는 부인이 있기도 하나 실천은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리어 해악만 부를 뿐이다."
「婦人有隨時朝夕衣服飮食之事 又有祭祀賓客之勞 何暇讀書 有或通古今史 講論禮 亦多不踐行 只爲害耳」|부인유수시조석의복음식지사 우유제사빈객지노 하가독서 유혹통고금사 강론례 역다불천행 지위해이중국어 「부녀자가 알아야 할 것」 성호사설 16권
그는 '여자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해야 하며,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지켜야 한다.[24] 고 했다. 또한 남녀간의 자유로운 연애 역시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여성이 화장을 하거나, 심하게 꾸미는 것, 결혼식 날 모여서 수다 떠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24] 여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이혼 역시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부인을 집에서 쉽게 쫓아내는 것 역시 당연하게 여겼다. 이혼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거나 이혼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3. 7. 실증주의 사물론과 탈중화주의
성호는 청대 고증학과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자구(字句)에 대한 교감·문자학과 음운학·훈고·추론 고증의 방법에 의해 경전을 연구하는 실용주의적 경학(經學)을 추구하였다. 성호는 현실생활을 도외시한 공허한 관념의 유희만을 즐기는 당시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하나의 경전이라도 능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경세치용적(經世致用的)인 경학을 주장하였다.[17]그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은 아니며 자주적인 학문 연구와 자주적인 세계관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선입견에 의하지 않고 실제 사실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였는데, 학문에 있어서 실증적 사유는 천문·지리·역사·제도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 당시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한 서학(西學)은 성호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는데, 세계관의 확대와 역사 의식의 심화, 전통적 중화관(中華觀)에서 벗어나게 하였다.[17]
3. 8. 중농주의 정책
그는 모든 사물의 근원은 농업이라 생각했다. 그는 농업을 기본산업으로 하여, 근검과 절약을 강조하는 절제를 바탕으로 상업을 억제하고 돈의 유통을 막아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호는 고향인 안산의 농촌에서 평생 동안 농민들과 지내면서 농촌 사회의 경제적 몰락을 실제로 체험하였다.[17] 그에 따라 그는 양반들에게도 직접 농사를 짓고 생산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지배층의 가혹한 수탈과 상업, 고리대 자본으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는 반면,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이탈되자, 적은 농사를 짓는 농민을 구제하는 토지 제도로 한 가구당 오늘날의 1,500평에 해당하는 50묘 정도의 영업전(永業田)을 한정하여 기본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17]
3. 9. 민족 주체성
이익은 '자아(自我)'의 자각을 통해 민족 주체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중화주의를 배척하고, 중국이 유일한 천자(天子)의 나라가 될 수 없으며, 서양의 각국이 각기 군주가 있어 자기 영역 안(域內)을 통치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의 독립적인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이는 허목 이후 나타난 남인 학파의 탈중화주의 사상의 연장이기도 했다.성호 이익은 “하(夏 : 中華)를 귀하게 여기고 이(夷)를 천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동국(東國)은 다름 아닌 동국일 뿐이다 (東國自東國), 우리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다르다.”라고 주장하여 소중화(小中華) 의식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인식하여 새로운 역사적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17] 그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도 전통적인 화이적 명분론이나 감정적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가 더불어 사는 상호 간의 교린(交隣) 체제 강화를 주장하였다.[17]
이익은 우리 나라 역사에 계통을 세워 재구성하기 위해 삼한(三韓)에 정통을 두는 ‘삼한정통론’을 강조하였다.[17]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기자조선을 민족사의 시원으로 간주하고 기자조선→신라를 거쳐서 고려, 조선으로 정통이 이어진다는 서인 노론계 사상과는 정면 배치되었다.
그는 단군이 처음 우리 나라를 일으켰고, 그 후 기자조선이 계승하여 남쪽으로 옮겨 마한(馬韓)이란 나라를 연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 역사의 정통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단군조선에서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과정 속에 하나의 계통을 찾아내려는 성호는 한사군(漢四郡)의 설치로 역사가 중단된 듯이 여겨졌던 공백 기간에, 마한으로 나라가 이어진 계통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통으로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17]
그의 정통론은 중국사가와 같이 자기 소속 왕조에 대한 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파악에 있어 체계성을 위한 것이었고 한 걸음 나아가 중국의 정통사상 [천자사상]을 극복하게 되었다. 성호에서 비롯한 이 정통론은 안정복·정약용으로 계승, 심화되었는데, 순암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였고, 다산 정약용에 와서는 현실론적 주장으로 중화주의(中華主義)의 절대성의 잔재가 일소되었으며, 나아가 현실성에 입각한 역사 이해를 가능케 했다.[17] 그의 삼한 정통론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그의 후계자이자 수제자인 안정복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간주하였고, 이후 단군조선-기자조선-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관의 모태가 되었다.
그의 이전의 남인, 북인의 학자들은 중화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남으로서 이전의 남인, 북인 학자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게 된다.
3. 10. 천주교에 대한 시각
이익은 천주교의 중심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취할 점도 있다고 보았다.[26] 이익은 원죄설, 천당지옥설, 처녀잉태설, 신 강림설, 예수부활설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27] 천주교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보며 이단에 대해 허용적이고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다.[27] 한우근은 천주교에 대한 이익의 허용적 입장을 "현실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 극도의 곤궁에 달하게 되는 그 이유가 정치의 잘못에 있는 것이지 이단의 폐해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8]반면, 신후담과 안정복[26] 등 공서파(功西派)는 천주교에 대해 철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27] 마테오 리치가 보이는 보유론은 유교인을 끌어들여 결국은 유교의 정신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포교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7] 신후담은 서학을 사학(邪學)이라고 단정하고 유학(儒學)을 옹호하였으며, 서학이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척한다고 비판했다.[27] 신후담과 안정복은 철학이나 종교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27]
3. 11. 사냥 남발과 육식에 대한 비판
이익은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으므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동물은 잡거나 죽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이 기르는 가축은 먹기 위해 키운 것이니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22]君子|군자중국어로서도 육식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욕망을 한없이 채우려고 거리낌 없이 살생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22]
이익은 사냥과 밀렵의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축이 아닌, 산과 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동물들의 생명을 인간이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냥과 어업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22]
3. 12. 도적에 대한 비판
그는 당시 의적으로 여겨지던 홍길동, 임꺽정, 전우치, 장길산에 대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로 확신하였다. 특히 그는 장길산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였다.[12]倡優|창우중국어·광대)로서 곤두박질을 잘하는 자로서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비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근심하여 신엽을 감사로 삼아 체포하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 후 병자년(1696년) 역적의 공초에 그 이름이 또 나왔으나 끝내 잡지 못하였다.[12]}}
'성호사설'에서 장길산을 임꺽정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 도적의 괴수로 단호하게 확신하였다.[12] 그는 장길산의 출신성분에 대해 그가 원래 광대 출신[12]이라는 설을 기록해두기도 했다.
3. 13. 신분제 타파 주장
그는 가혹한 노비제와 서얼 차별의 사회상을 비판하였다. 천인도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다양한 인재를 등용시키고, 노비의 수를 줄여 양인(良人)이 늘어나면 국가의 조세와 부역 또한 많아져 국가의 재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17]3. 14.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
이익은 사리의 분별과 겸손하고 근검 절약하는 예(禮)를 강조하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분수에 맞는 예식을 치를 것을 주장했다.[17]4. 저서
- 《성호사설》(星湖僿說): 1720년대부터 독서 잡기 및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한 것을 문중 조카들이 정리하여 1760년경 완성한 백과사전이다.[1]
- 《성호문집》(星湖文集): 27책의 퇴로본과 26책의 서포본 두 종류가 있으며, 시, 부, 서, 잡서, 서, 기, 제발, 제문 등 방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2]
- 《이자수어》(李子粹語): 이자는 퇴계 이황에 대한 존칭이며, 수어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퇴계 이황과 그 제자들의 글 중에서 학문과 인격수양에 긴요한 글을 가려서 종류별로 엮은 책이다.[3]
- 《성호질서》(星湖疾書): 질서란 빨리 쓴 글이라는 뜻이다. 경학에 대한 비판적이고 고증학적인 연구들이 담겨 있다.[4]
- 《곽우록》(藿憂錄): 곽우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곧 이익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재양성과 관료선발, 법제개혁 및 통치일반론, 재정과 화폐문제, 토지소유문제, 국방 등 방대한 분야의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실려있다.[5]
- 《사질유편》[6]
- 《예설유편》[7]
- 《관물편》[8]
- 《백언해》[9]
- 《사서삼경》[10]
5. 관련 유적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5번지에 이익선생묘가 있다. 묘실과 재실, 사당, 안내판 등이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40호이다.[1]
6. 가족 관계
| 관계 | 이름 | 비고 |
|---|---|---|
| 증조부 | 이상의 | |
| 조부 | 이지안 | |
| 아버지 | 이하진 | |
| 어머니 | 용인 이씨 | 이후산(李後山)의 딸 |
| 형 | 이해 | 1647년 ~ 1673년, 호는 청운 |
| 형 | 이잠 | 1660년 ~ 1706년, 호는 섬계 |
| 형 | 이서 | 1662년 ~ 1723년, 호는 옥동 |
| 어머니 | 안동 권씨 | 권대후(權大後)의 딸 |
| 형 | 이침 | 1671년 ~ 1713년 |
| 조카 | 이용휴 | 1708년 ~ 1782년, 호는 혜환, 이가환의 아버지 |
| 부인 | 고령 신씨 | |
| 부인 | 사천 목씨 | |
| 아들 | 이맹휴 | 1713년 ~ 1750년, 호는 두산 |
| 손자 | 이구환 | 1731년 ~ 1784년, 호는 가산 |
이복 형 이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으나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고, 둘째 형은 요절하였다.[1] 셋째 형 이잠은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첫 스승이었다.[1] 넷째 형 옥동 이서(玉洞 李漵)는 후사가 없는 셋째 삼촌 이주진의 양자로 갔고,[1] 다섯째 형 이심(李沈)도 후사가 없는 다섯째 삼촌 이명진의 양자로 갔다.[1]
맏형 이해는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이하진보다도 앞서 요절했고, 셋째 형 이잠은 후일 노론에 의해 장살당했다.[1] 후사가 없던 맏형 이해의 양자는 다섯째 삼촌 이명진의 양자로 간 이심의 아들들 중 이광휴가 되었고, 셋째 형 이잠의 양자는 이병휴가 되었다.[1]
참조
[1]
서적
[2]
서적
[3]
서적
[4]
서적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9]
서적
朝鮮儒教の二千年
朝日選書
[10]
서적
[11]
서적
日本人の檀君硏究
https://doi.org/10.1[...]
한일관계사학회
2021
[12]
뉴스
샘이깊은물 35. 이익 성호사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4-07-19
[13]
뉴스
샘이깊은물 35. 이익 성호사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4-07-19
[14]
간행물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제12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15]
문서
[16]
간행물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제12권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17]
웹사이트
성호 이익의 학문과 사상
http://seongho.iansa[...]
[18]
서적
한국사 100 장면
가람기획
[19]
서적
한국사 100 장면
가람기획
[20]
문서
[21]
웹사이트
도산서원도
http://www.ocp.go.kr[...]
[22]
뉴스
약자의 살을 삼키는 육식
http://www.hani.co.k[...]
경향신문
2008-05-16
[23]
뉴스
정적의 아들도 정적?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1-02-18
[24]
서적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효형출판
[25]
서적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효형출판
[26]
서적
한국 철학의 맥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7]
서적
한국 철학의 맥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8]
서적
성호 이익 연구
한국학술정보
[29]
서적
재상:한국편
이가서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